자유게시판
조우성(65회) 인천시립박물관 관장/경기교육신보 1호 독자를 찾아서(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15.10. 7)
끊어진 인천 언론의 맥 이은 유일한 신문
경기교육신보 1호 독자를 찾아서-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 조우성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이 경기교육신보 창간호를 들고 상념에 잠겨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오늘 같은 날을 고대했다. 40년간을…" 지난 6일 인천시 연수구 청량로 인천시립박물관 조우성(67) 관장의 목소리가 바르르 흔들렸다. 그의 양손은 세월의 때가 물씬 묻어나는 타블로이드판의 누런 종잇장을 맞잡고 있었다.
1975년 10월 10일(금요일)자 창간호 경기교육신보(京畿敎育新報)
"인천의 언론 공백기를 메웠었지, 지금 일간지 기호일보가 시민의 입이라면, 당시 주간지였던 경기교육신보는 교육계의 입이었어."
그의 기억은 벌써 혈기왕성했던 스물일곱 나이의 광성고등학교 국어 교사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1973년 8월 31일 인천 언론은 ‘죽음의 날’을 맞았다. 인천에 본사를 둔 일간지 ‘경기매일신문’과 ‘경기일보’가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을 둔 연합신문에 흡수 통합됐던 것이다. 군사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1도(道)1사(社) 정책의 직격탄이었다.
강제로 통합된 3사의 새 이름은 ‘경기신문’으로 본사는 역시 경기도 수원이었다.
"인천의 자존심은 땅속으로 꺼졌지. 그도 그럴 것이 언론 3사 중 가장 사세가 약했던 연합신문에 흡수됐으니까. 그것도 수원에 있는 신문사한테…"
인구 100만 명의 도시, 인천은 그 뒤 15년 동안을 신문사 없는 암흑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다.
발행부수 7만 부로 인천과 경기도를 통틀어 가장 큰 언론 매체였던 경기매일신문의 기자들도 한순간 실직자 신세로 전락했다.
"언론에 대한 목마름을 달래기 위한 몸부림의 열매가 바로 ‘경기교육신보’야." 인천에 뿌리를 둔 신문이 하나도 없는 비문화 도시에 살아야만 했던 인천인들은 자존감 회복에 나섰다.
"그때 정부는 1도1사 이외의 새 일간지나 종합지 등록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편법을 쓴 거야"
정부가 일간지 등록을 막자, 인천 언론인들은 교육을 다루는 특수 주간지로 눈을 돌렸다. 끊어진 인천 언론의 맥을 잇고자 한 처절한 고민이었다.
이렇게 탄생한 것이 기호일보의 전신인 경기교육신보였다. 경기교육신보는 1988년 6·29선언으로 언론계에 봄이 찾아오기 전까지 15년 동안 인천 언론의 공백기를 메웠다. 인천 유일의 언론사로 향토 교육문화의 공기(公器)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지방지가 올곧지 못하면 그 지역 역시 바로 설 수 없다." 경기교육신보부터 기호일보까지 40년을 지켜본 조 관장은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지방지는 그 지역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지역인의 삶을 공유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어설프게 중앙지 시늉을 내거나 중앙지에 끼어들어가는 병독지로 남아 있어서는 지방지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고 정교하고 예리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때 비로소 지방지의 진정한 가치가 나온다." 조 관장이 경기교육신보를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처럼 기호일보에 거는 기대다.
박정환 기자 hi21@kihoilbo.co.kr
2015년 10월 08일 목요일 제2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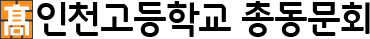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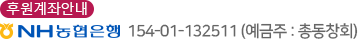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