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임근수(33회, 인상21회), 인천 인물로 호출해야"(퍼온글)
본문
퍼온곳 : 경인일보(16. 2. 1)
인천 덕적도 '최초 문화보고서' 발굴 의미
전설·방언 등 생생한 기록 "임근수, 인천 인물로 호출해야"

1942년 6월호 월간종합잡지 '조광'에 실린 임근수의 덕적도. /윤진현 박사 제공
지형·풍경 아닌 주민 생활상 자세히 다뤄… 자료적 가치 충분
저자 인천상업학교 졸업후 20대 교사때 능동적 섬 답사기 눈길
희관(晞觀) 임근수(林根洙, 1916~1979)가 1942년 월간종합잡지 '조광'(朝光)에 투고한 '덕적도' '다시 덕적도'는 방언과 어부가(漁夫歌) 등 덕적도의 문화를 자세히 처음 다뤘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글쓴이가 언론학계의 선구자로 불리는 임근수 전 서울대 교수라는 점도 눈에 띈다.
■ 덕적도 최초 문화 보고서
덕적도 주민들의 방언과 생활 등이 자세히 기록된 자료는 1985년 발간된 김광현의 '덕적도사'(德積島史)다.
19세기 중엽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덕적서'(德積序)도 있지만, 여기에는 주로 지형과 풍경이 담겨 있다. 덕적도 전설·방언·생활상 등을 자세히 기록한 글은 임근수의 글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주변 바다에서 민어와 조기가 많이 잡히고, 여자들이 농사를 짓는다는 내용은 '임근수 글'과 '덕적서'에 공통적으로 나온다. 임근수는 "남상선업녀상경운(男尙船業女尙耕耘)은 이 섬 전체의 굳은 향약이라 한다"고 했으며, '덕적서'에는 "백성들은 상선을 업으로 삼고, 여자들은 밭을 갈고 김을 맨다"고 기록돼 있다.
임근수 글에 나오는 어부가는 '덕적도사'에도 등장한다. 임근수가 옛적부터 내려오는 어부가로 예를 보인 '앞산은 가치가고 뒷산은 멀어간다. 어기어차 뱃소리에 우리배 절로 간다'는 덕적도사에도 있다.
하지만 '나무 배는 막걸리만 먹는데, 우리 배는 아령주만 먹는다'(임근수 글)와 '너무배 동사는 막걸리 먹는데, 우리배 동사는 맑은술 먹는다'(덕적도사)처럼 일부 내용이 변화된 점도 확인된다.
임근수는 일곱멧겡이(여자·여아) 등의 방언을 소개했는데, '덕적도사'에는 나오지 않은 단어들이 많다. 임근수는 글에서 "어조로 보아서는 충청도 말 플러스 황해도 말이라고 하겠으나, 대체로 충청도적인 데가 많다"고 했다.
있서라오(있습니다), 왜라오(왜 그래요), 그랬지라오(그랬습니까) 등 충청도 영향의 어미(語尾)는 지금도 쓰이고 있지만, 뱀자(배 임자) 등 어업관련 방언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게 주민들 이야기다.
윤진현 문학박사는 "덕적도의 역사를 연구할 때 첫 번째로 다뤄야 하는 것이 임근수 글이다. 내용 면에서도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했다.
■ 임근수 '인천 인물'로 호출해야
글쓴이 임근수는 임영균(林榮均, 1904~1966)의 동생이다. 임영균은 인천 최초로 치과의원을 낸 사람으로, 문학·연극·신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임근수는 인천상업학교(현 인천고)를 졸업한 후 연희전문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했다. 이후 영창중(현 성동중고)과 배재중에서 교사 생활을 했다.
1942년 '조광'에 덕적도 글을 투고했을 당시에는 영창중 교원이었다.
임근수는 코리아타임즈 기자, 서울신문 상무이사 등 언론계에 종사하다 홍익대·중앙대를 거쳐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언론학회는 언론학계의 선구자인 희관 임근수 선생을 기려 '희관언론상'을 제정하기도 했다.
윤진현 박사는 "인천 출신의 20대 청년이 능동적으로 인천 섬을 답사하고 기록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에 함세덕이 섬을 배경으로 한 희곡을, 김동석이 수필 '월미도' 등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젊은 문인들의 관심은 '섬'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인천의 무엇을 발굴하고 누구를 키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남아 있는 인천의 기반들을 발굴하고 기록해야 한다. 임근수를 인천 인물로 호출하는 작업부터 필요하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발행일 2016-02-01 제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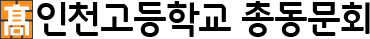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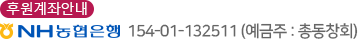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