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정이 평탄하고 순조로웠다(旅途平順).” 1371년 오늘의 산동반도에서 이곳에 배편으로 도착한 명나라 장수 마운(馬云)은 그렇게 적었다. 여순(旅順)이란 이름이 생겨난 배경이다. 그곳에 안중근 의사의 순국 유적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 안 의사의 하얼빈 거사에서 시작된 여순까지의 여정이 순조로울 수는 없었겠으나 백여 년이 지난 지금 그곳의 법정과 감옥 등은 몇 차례 곡절을 겪으면서도 끝내 살아남아 우리를 숙연케 하고 있다. 지난 11월 중순 나는 그곳에 있었다.
안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일제의 관동도독부 법원 청사와 고등법원 1호 법정, 영어의 몸이 됐던 여순일아감옥구지(旅順日俄監獄舊址), 그리고 대략 2㎞가 안 되는 감옥과 법원 사이의 길, 안 의사가 교수형 당한 여순 감옥의 동쪽 망루 부근 등을 내눈으로 직접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육신은 떠났으나 영원히 죽지 않을 민족혼을 상징하는 안중근 의사’를 새삼 느껴볼 수 있었다.
안중근, 민족사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수도 없는 그 이름 곁에 불쑥 김구 선생의 모습이 오버랩된 것은 웬 일이었을까? 선생이 쓰신 ‘백범일지’에 안중근의 부친과 그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있어서만이 아니었다. 선생께서는 안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하기 13년 전,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 나루터에서 민비 시해를 복수하고자 일본군 장교 쓰치다를 죽였고 이후 해주에서 체포돼 당시 인천감리영(인천시 중구 내동 한진아파트 자리에 있었다)으로 이송,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았었다. 사형을 언도받았으나 사형 집행 2시간 전에 극적으로 집행이 연기됐고 이후 인천의 감옥을 탈출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김구 선생과 인천 감옥의 기구한 인연은 계속된다.
한일병합 후 안중근 의사의 4촌 형제가 되는 안명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끌려온 민족지도자들과 함께 수감돼 징역 15년 형을 받고 서대문 감옥에 있다가 다시 인천 감옥으로 이감됐던 것이다. ‘백범일지’에 당시의 모습이 기록돼 있다. ‘쇠사슬로 허리를 얽혀서 인천으로 끌려갔다. 무술 3월 초열흘 날(1898년 음력 3월10일 / 필자) 밤중에 옥을 깨뜨리고 도망한 내가 17년 만에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다시 이 옥문으로 들어올 줄을 누가 알았으랴. 문을 들어서서 둘러보니 새로이 감방이 증축됐으나 내가 글을 읽던 그 감방이 그대로 있고, 산보하던 뜰도 변함이 없다.’
인천 감옥에 이감된 후 김구 선생은 아침마다 다른 죄수 하나와 쇠사슬로 허리를 마주 매여 축항공사장(당시 총독부는 현재의 제1부두와 제2부두가 만나는 곳에 축항을 만들고 있었다)에 끌려가 흙지게를 등에 지고 십여 길이나 되는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며 노역을 했다. 공사장에서 노역하기를 보름이 채 못 돼 어깨는 붓고, 등은 헐고, 발은 부어서 운신조차 어려워 사닥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결심도 했으나 마주 옭아맨 상대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선생은 당시를 술회하고 있다.
백범 김구와 인천의 옛 감리서 터는 이렇듯 역사적 의미가 뗄 수 없도록 연결돼 있는데 오늘날 그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으니 어찌 안타까운 심정이 들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의 감리서는 인천의 개항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행정 중심이 문학동에서 옮겨온 것은 둘째치고라도 인천항재판소(김구 선생이 재판 받은 곳)가 설치된 것을 비롯해 그곳에다 일제는 인천부청(오늘의 인천시청에 해당)을 지으려고 했다가 현재의 중구청 자리에 신축하기도 했었다.
나는 여순 감옥에서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며 멀리 인천의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된 김구 선생을 함께 생각하고 있었다. 타오르는 독립의 의지가, 일신을 던지는 지고한 민족정신의 발로가 백여 년 전 시공을 뚫고 내 등살을 꿈틀거리게 하는 까닭은 내 속에 흐르는 피의 원형질에 그 분들과 동질의 분자가 섞였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지금 인천의 그곳에는 김구 선생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서글픔과 부끄러움이 나를 더욱 감상에 빠져들게 했다. 먼 이국 땅에도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 것을 우리는 아예 깨끗이 망가뜨리고 그 잘난 아파트 몇 채를 지어 버렸다니…. 역사는 결코 공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는 것으로 그곳을 떠나면서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곰곰 되씹어보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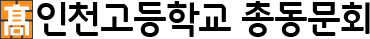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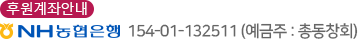
 itoday@i-today.co.kr
itoday@i-today.co.kr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