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화가 인생 30년 전시하는 김병종(71회) 교수(퍼온글)
본문
[김윤덕의 談笑] "아프리카서 새로운 色에 눈떴지, 아주 원초적인 色"
김윤덕 기자
입력 : 2014.01.14 03:03 | 수정 : 2014.01.14 05:16
퍼온곳 : 조선일보(14. 1.14)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화첩기행' 전집 5권 출간, 화가 인생 30년 전시하는 김병종 교수]
그림 여행 종착지는 북아프리카
사하라부터 카뮈의 집까지 담아 4번이나 개작… 가장 애틋한 여정
화첩기행 5권 북아프리카 편의 표지화로 쓰인 그림. 김병종(61) 교수는 매우 의뭉스럽게 사람을 웃겼다.
"아프리카 갔을 때 처음 보는 색깔이 많아 가이드한테 '이건 무슨 색이냐' '저건 무슨 색이냐' 하고 물으니, 가이드가 왜 자꾸 색, 색 하냐고 해요. 그래서 '나는 색을 쓰는 남자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종이 위에서만!'이라고 했지요." 그러자 가이드가 옆에 있던 김 교수의 아내에게 묻더란다. "당신의 남편이 정말 색을 잘 씁니까?" 아내 왈, "성실하긴 하지요." 김 교수의 아내는 이상문학상, 오늘의 작가상 등을 받은 소설가 정미경씨다.
아이처럼 엉뚱하고 천진해 보이지만 관능의 미학이 물씬한 그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김병종 서울대 교수가 올해 화업(畵業) 30년을 맞았다. 지난 10일 전북도립미술관에서 개막한 '김병종 30년, 생명을 그리다'전(2월 16일까지)에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명창 안숙선 등 각계 명사들을 비롯해 500여명 인파로 북적였다.
'경사'는 또 있다. 조선일보에 1998년 '김병종의 화첩기행'으로 시작, '신화첩기행' '라틴화첩기행' 등 2007년까지 이어진 '화첩기행'이 5권 전집(문학동네)으로 최근 출간됐다. 화가이면서 글쓰기에도 남다른 재주를 보였던 김 교수의 화첩기행은 대입수능시험 지문으로 등장할 만큼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학교로, 작업실로 선물 보내오시는 분이 어찌나 많았는지. 그러니 학장에 미술관장까지 대학 보직 수행하느라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와도 마감 시각에 맞춰 원고 쓰느라 고생깨나 했지요. 어휘 하나, 표현 하나에 매달려 고심할 때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한순간이 있었어요. 신림동 시장에 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내 글이 실린 신문지로 생선을 싸주고 있더라고요. 순간 묘한 평화가 깃들더군요. 섭섭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워졌지요(웃음)."
-

 최근 어느 신인문학상 시상식에 다녀왔다는 김병종 교수는 “이 나이에도 젊은 작가들과 진검승부를 겨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며 웃었다. /주완중 기자
최근 어느 신인문학상 시상식에 다녀왔다는 김병종 교수는 “이 나이에도 젊은 작가들과 진검승부를 겨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며 웃었다. /주완중 기자
최근 어느 신인문학상 시상식에 다녀왔다는 김병종 교수는 “이 나이에도 젊은 작가들과 진검승부를 겨뤄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며 웃었다. /주완중 기자
5권으로 출간되는 화첩기행 전집에는 신문에 연재하지 않았던 '북아프리카'편이 추가됐다. 2008년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를 여행하며 치열하게 쓰고, 열정적으로 그린 기록이다. 4번이나 고쳐 썼을 만큼 가장 애착이 간다고도 했다. "위험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는 지역이었지요. 호텔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아침식사에 계란도 안 나오더군요." 그러나 김병종은 "거기서 죽어도 좋았다"고 할 만큼 북아프리카, 그중에서도 사하라의 풍광을 극찬했다. "튀니지 시내에서 자동차로 12시간 가야 하는 사하라 사막의 한 캠프에서 머문 적이 있어요. 황혼이 9가지 색깔로 변해가며 지는 모습을 보고 잠들었는데 이른 새벽 가느다란 비명이 들리는 겁니다. 동행한 아내가 낙타도 즉사시킨다는 불뱀에 물린 게 아닌가 싶어 벌떡 일어났더니 뭔가 시뻘건 게 이글거리고 있더군요. 태양이었죠. 우리는 항상 원근에서 해를 봐왔잖아요. 원근이 없이 태양이 바로 떠버리니 아내는 아주 작은 점으로 서 있고 해는 피가 튀기듯이 떠오르고 있던 겁니다."
스스로를 '카뮈 키즈'라고 할 만큼 알베르 카뮈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김 교수가 그가 살았던 곳을 찾아 헤맨 사연도 재미있다. "정말 황당한 게,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위대한 작가의 집에 문패 하나가 없더라고요. 알제리와 프랑스에서 중간자적 삶을 살아서였을까요. 극빈촌 단칸방에 살면서도 분노하거나 래디컬한 문장이 아니라 그렇게 탐미적인 문장이 나왔다는 게 역설적이더군요. 아, '이방인'의 주인공 뫼르소가 '왜 사람을 죽였느냐'는 질문에 '햇볕이 너무 강해서'라고 답한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팩트(사실)더군요. 알제리 해변은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망막에 상처가 날 만큼 햇빛이 공격적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가 아니라 왜 위험하고 여행하기 불편한 아프리카를 택했느냐고 묻자 김 교수가 다시 '색(色)'을 이야기했다.
"색이 일용할 양식처럼 쓰이는 땅이었으니까요.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는 서양미술사에만 국한돼 살아온 저를 새롭게 눈뜨게 했어요. 그곳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시커멓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검은색 자동차조차 보기 어렵지요. 삶 자체를 오브제로 여기고 즐기는 그들에게서, 반들반들한 도시문화, 자본의 사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꼭 가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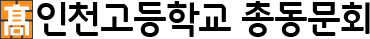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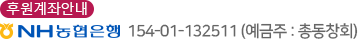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