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원우(81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애장도서전(퍼온글)
본문
퍼온곳 : 기호일보(15. 8.17)
국가와 국민의 관계 복종에서 평등으로
9.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2015 인천 세계 책의 수도’ 지정을 기념해 기호일보사와 인천문화재단이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인천시민과 명사가 함께하는 애장 도서전’ 아홉 번째 명사로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만났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만들어진, 1914년판 오토 마이어(Otto Mayer)의 「독일 행정법(Deutsches Verwaltungsrecht)」이 아홉 번째 애장도서다. 독일 내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하물며 지구 반대편을 돌아 대한민국에서 소장하고 있으니 무척이나 진귀한 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전공 책을 많이 읽는다며,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 결국 자신의 전공 서적을 선택했다는 이원우 원장을 다시 한 번 물끄러미 쳐다보게 된다.
그럼 이원우 원장을 통해 100년 전 오토마이어가 제시한 독일 행정법이 현대사회에 어떤 고민을 주고 있는지 들어보자.
# 공부가 하고 싶었던 서울대 82학번 ‘똥파리’

이원우(52)원장의 한때 별명은 ‘똥파리’였다.
1982년 서울대 법대는 졸업 정원의 130%를 뽑았다. 갑작스레 인원도 늘어났을뿐더러 그들은 어디든 떼 지어 잘 몰려다녔다. 학교 선·후배들은 숫자도 많고 발음이 ‘파리(82)’와 비슷하다 해서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을 ‘똥파리’로 불렀다.
그의 ‘똥파리’ 동기 중에는 제법 유명인들이 많다.
몇 년 전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를 비롯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한때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다가 현재는 반공 인사가 된 김영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연구위원 등도 이 원장의 동기들이다.
‘똥파리’들은 정치권에도 포진해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새누리당 나경원(서울 동작구을), 조해진(경남 밀양시 창녕군) 국회의원 등도 이 원장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
82학번 동기들이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것처럼 학창 시절 공부가 더 하고 싶었던 그는 모교의 로스쿨을 책임지는 학자가 됐다.
"나는 운이 좋게 포항제철에서 주는 장학생에 선발돼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5개국 중 한 곳을 고를 수 있었죠. 그중에서도 우리와 같이 분단국가였다가 통일이 이뤄지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독일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나라 행정법의 뿌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이 의외였죠. 독일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땐 주변 사람들이 미쳤느냐고 했어요. 유학하기 좋은 미국이나 일본이 아닌 적응하기도 어렵고 언어도 새로 배워야 하는 독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죽으나 사나 독일로 간다. 유학 못 가면 사시(司試) 보고 변호사 해서 돈이나 벌자’는 심정으로 유학을 강행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고등학교(81회)를 졸업한 그는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림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 행정법의 등장, 법치주의의 시작
"책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오토마이어란 인물을 소개해야 합니다. 오토마이어는 ‘행정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신나고 재미있는 행정법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실 행정법이라는 것은 법에 없었어요. 법은 국민 상호 간의 관계를 말했죠. 대등한·평등한 사람들끼리의 합리적으로 서로 계약하는 관계, 지금 말하는 민법을 예전에는 법 관계로 본 거에요. 국민과 국가 간에는 법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권력에 의한 관계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소송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복종해야 하고, 억울하면 읍소를 해야 했죠. 그게 전통적인 법이었어요."
이러한 법체계는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국가가 시민들을 일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합리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관계가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토마이어는 기존의 행정학적 방법에서 벗어나 법학적 방법에 의한 행정법학을 완료해 독일 행정법학의 기초를 닦았다.
아울러 오토마이어는 법치행정의 원리로 ▶법규성을 가진 규범은 대의기관에서 만들어지고(법률의 법규 창조력) ▶행정의 집행권은 그 자체로서 자유이고, 일부에 대해서만 독자적 행동 배제(법률의 유보) ▶국가 행정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된다(법률 우위의 원칙) 등의 3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행정법을 하나의 법으로 만든 것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행정법이 제일 처음 발전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공법(公法·public law)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도 법에 따라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혁명, 자유주의 혁명을 제도화해서 지속적이게 만드는 것이 법치주의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법의 시작은 프랑스에서 시작됐으나 단순히 판례만을 모으는 것에 그치다 보니 체계적으로 정립되진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 행정법을 공부하던 오토마이어가 독일 행정법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해 제일 처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번에 소개되는 「독일 행정법(Deutsches Verwaltungsrecht)」이 된 것.
이 원장은 "이 책은 행정법이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처음 만들어진 행정법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다. 지금까지도 독일 행정법은 세계적으로도 행정법의 근간이 되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 분열된 갈등 봉합 위해 만들어진 행정법
"독일이 언제 생겼는지 알아요? 역사적으로 길게 보는 사람들은 신성로마제국을 독일로 보죠. 그렇지만 꼭 독일만의 나라라고는 볼 수 없어요. 1871년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면서 처음으로 ‘도이칠란트’란 말을 쓰게 됐죠. 앞서 독일은 300여 개의 군소국가로 나뉘어 있었어요. 당시 유럽 맹주였던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독일을 견제하면서 분열시켰죠. 적게는 250여 개에서 많게는 350개의 군소국으로 쪼개졌었죠."
분열된 국가는 강해지기 힘들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분명히 같은 민족이고 같은 말을 쓰는 한 혈통인데, 정치적으로 나라가 나뉜 것. 결국 비스마르크가 오스트리아를 뺀 소독일 형태로 통일시켰고, 그 과정에서 행정법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오토마이어가 독일에서 처음 행정법 교수를 지낸 곳은 알자스 지방에 있는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이었어요. 프랑스 땅이었는데 1871년 독일이 점령하면서 독일 영토가 된 곳이에요.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 배경이 된 곳이죠. 당시 독일은 통일은 됐지만, 주마다 법이 다 달랐어요. 오토마이어가 1886년에 낸 ‘프랑스 행정법 이론’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는 적용됐지만, 다른 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죠. 그는 ‘분열된 갈등을 통합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통일돼야 하고, 통일된 법체계 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때문에 독일 법 시리즈를 기획하게 됐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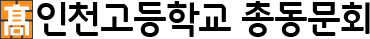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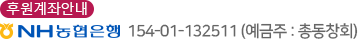










댓글목록 0